그런데 위기 시에 상당량의 분유가 원조 물자로 공급된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히 분유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럴수록 아기들의 질병 발생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다시 재난 국가의 관료들이 원조 물자를 공식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생필품보다도 분유를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 구호 및 원조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위기 시에 분유를 원조 받는 것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분유가 아니라 모유 수유 지원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례로 1998 ~ 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일하던 리타 바샤(Rita Bhatia)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영양전문가는 약 6,000개의 분유병을 소각(燒却)했다고 한다. 11) 당시 세르비아계의 소위 인종 청소라 불린 학살을 피해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등 인접 지역으로 피신한 코소보 난민 숫자가 대략 60만 명이 넘는다.
<1999년 4월 12일자 TIME지(紙) 표지>
- 알바니아계 여인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마케도니아 국경선을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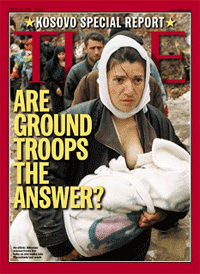
위기시의 분유 공급은 해당 지역 사회에 좀 더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모유 수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분유 사용으로 인해 평시 체제로 회복된 후에도 분유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분유 관련 업체의 판매 전략이 되어 위기 시에 의도적으로 분유를 무상 원조하기도 한다고 한다. 비상시 구호품이던 분유가 평시에 상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난 시에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진 틈을 타, 분유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마치 화폐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비상시 구호물자에 대한 분배나 유통을 당국이 일일이 관리·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자신이 1998년 아프리카 기니(Guinea)의 난민 캠프에서 직접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당시 UNHCR의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상 걸인(乞人)과 다를 바 없는 난민들에게는 UN에서 무상 지원하는 모든 물자가 그들 내부에서 거래의 수단이자 대상이 되었다.
간밤에 큰 아들과 같이 잤다. 작은 아들은 제 할머니와 잤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딸과 잤다. 아내 말이 셋째는
딸이어서인지 젖 빠는 힘이 아들들보다 약하다고 한다. 그래도 젖은 잘 돈다. 국내외의 엄청난 응원의 함성 속에 우리 가족의
노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힘이 난다. 나도 1년이나 육아 휴직을 얻었다. 우리 딸이 기뻐하는 것 같다. 이번 모유 수유는 출발부터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모유 수유에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보는 산모들이 왜 이리도 많은 걸까. 모유의 필요성이나
수유의 기본적인 요령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생아를 처음 안게 되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경우는 친정어머니 같이
나이 드신 분들마저 분유를 더 선호하시니 어찌된 노릇일까. 모유 수유가 산모에게도 좋다는 걸 모르는 걸까.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열악한 면이 많은 것인가.
11)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