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제사회에서 모유 수유는 다분히 인권(人權)과 결부되어 있다. 즉, 아기는 좋은 영양을 섭취할 권리, 산모는 아기에게 모유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협약 제24조는 직접 모유 수유를 언급하며 당사국에게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및 지원을 받도록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1948년 12월 10일 제5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제4조)이나 1990년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제11조)에서 모든 사람이 식량에 대해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개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천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 동안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며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services)를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두 협약 모두 당사국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경우 1991년 11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1984년 12월에 각각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모성 보호 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과 세계보건기구회의(World Health Assembly, WHA)가 1981년에 채택한 ‘모유 대체 식품 영업에 관한 국제 규정'(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등도 모유 수유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BFHI 운동과 더불어 ‘Innocenti 선언'이 낳은 또 하나의 산물인 ‘세계 모유 수유 운동 연맹'(World Alliance for Breasfeeding Action, WABA) 8) 도 모유 수유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 조직이다. 1991년에 창설되어 UNICEF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세계 모유 수유 주간'(World Breastfeeding Week, WBW) 캠페인은 12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모유 수유 운동이다.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은 보통 매년 8월 1~7일에 시행되는데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모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가령 2001년의 경우 ‘정보화 시대의 모유 수유'(Breastfeeding in the Information Age)를 주제로 모유 수유 관련 정보의 공유, 엄마와 아기의 의사소통으로서의 모유 수유 등을 강조했다.
<2001년 WBW 포스터 ‘정보화 시대의 모유 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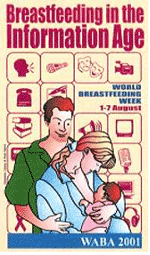
그런가하면 ‘국제 아기 식품 행동 연대'(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 IBFAN)라는 국제 조직은 모유 수유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바른 살림상'(Right Livelihood Award, RLA)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노벨상보다 하루 일찍 시상식을 갖는 RLA는 대체 노벨상으로 유명한 상이다. 세계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경의를 표하고 지원을 보내는 것이 이 상의 주된 취지이다.
<IBFAN의 RLA 수상 장면> 9)

1979년에 조직된 IBFAN의 본래 활동 목표는 ‘모유 대체 식품 영업에 관한 국제 규정'의 확산과 철저한 이행이었다. 그 배경에는 과거, 특히 1950~60년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고도의 분유 판촉 전략을 통해 판매고를 올리면서 모유 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했던 전례가 있다. 기업체들의 교묘한 마케팅 활동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가령 영업 직원이 건강 상담원 행세를 하면서 분유가 모유보다 훌륭하다는 식으로 산모들을 호도한다. 또는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부인과나 소아과와 결탁하여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도 한다. 분유 광고 시에는 의례 ‘과학적', ‘현대적' 운운하며 모유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다는 인상을 준다. 분유를 먹은 아기가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분유를 먹이는 엄마는 편하고 자유롭게 비춰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분유 제조업체가 더 높은 수입을 거둘수록 아기들은 생명을 잃어갔다. 분유에 탄 물이 안전하지 못해서 아기가 설사를 계속하고 결국 탈진을 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또 분유에는 모유에서 얻을 수 있는 면역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저항력이 없어서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도 한다. WHO에 의하면 이렇게 모유만 먹고 자라야할 아기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는 숫자가 매년 적어도 150만 명이라는 것이다. ‘모든 여성이 오직 모유만을 아기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아기들은 출생 시부터 4-6개월까지 오직 모유만을 먹어야 한다'는 Innocenti 선언은 그러므로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모유 수유가 인권으로서 존중받아야할 당위성이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위기 시에는 참으로 절박해진다. 즉, 전쟁이나
지진, 홍수, 가뭄 또는 전염병의 확산 등 재난 시에 모유 수유는 아기의 인명 구조 그 자체이다. 아기의 생존 차원에서 어머니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야하고 또 해야만 한다. 모유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재난 시에는 우선 위생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 일시적으로 많은 인구가 일정 지역에 밀집함으로써 식수나 연료도 부족해진다. 분유 그 자체로도 모유만큼 안심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제대로 활용마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식량 안보(food security)의 문제인 셈이다. 가령 1991년 걸프 전쟁
직후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族)이 이라크에 대해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랬다. 이라크군(軍)의 강경 진압으로 약 250만
명의 쿠르드 난민이 발생했다. 본래 건장한 쿠르드인들이었지만, 분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10)
8) http://www.waba.org.my/
9) http://www.ibfan.org/site2005/Pages/article.php?art_id=235&iui=1
10) The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Newsletter, Sept./Oc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