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에 나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자녀 셋, 그것도 아들, 아들, 딸로 두고 싶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자연분만, 산후조리 등 적잖이 염려되는 것들이 있었다. 다행히 순산은 했는데, 두 아들 녀석이 워낙 기운이 세다 보니, 이 녀석들 틈바구니 속에서 막내딸을 돌보며 아내가 제대로 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경우 다른 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실 모유 수유였다. 첫째가 신생아 황달 때문에 입원해있는 바람에 아내와 아기가 떨어져 지냈던 시절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우리 첫째, 아내, 나,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모두가 몹시도 괴로웠다. 아내와 아기의 별거(?) 이유는 단순했다. 자연 분만의 경우 산모의 입원 기간이 2박 3일로 정해져 있었던데 반해, 황달인 신생아는 입원 치료를 더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실정이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제도였다. 과거에 보건복지부가 정했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상의 분만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이후에도 관행화된 2박 3일의 입원기간 등 더 밝히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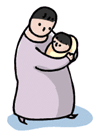 아무튼
초유 수유를 원활히 하지 못했던 것은 두고두고 고생이 되었다. 초유시기를 놓치고 나니 모유 수유는 가족 모두의 희생이 아니고는
성공할 수 없는 처절한 역경의 과정 그 자체였다. 사실 우리는 모유 수유를 애초부터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다. 아내나 나나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기는 당연히 모유로 길러야 좋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아들의 모진 울음소리,
아내의 지친 한숨 속에서 나는 궁금해졌다. 가뜩이나 모유 수유율이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1) ...
모유 수유의 향상을 위한 정책은 어떤 내용일까,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게 되었다. 정말 놀라웠다.
아무튼
초유 수유를 원활히 하지 못했던 것은 두고두고 고생이 되었다. 초유시기를 놓치고 나니 모유 수유는 가족 모두의 희생이 아니고는
성공할 수 없는 처절한 역경의 과정 그 자체였다. 사실 우리는 모유 수유를 애초부터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다. 아내나 나나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기는 당연히 모유로 길러야 좋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아들의 모진 울음소리,
아내의 지친 한숨 속에서 나는 궁금해졌다. 가뜩이나 모유 수유율이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1) ...
모유 수유의 향상을 위한 정책은 어떤 내용일까,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게 되었다. 정말 놀라웠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00년 6월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복지정책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다. 그 계획 속에는 1997년 현재 14%인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을 2005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과연 달성되었을까?) 그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첫째, ‘모자동실제' 도입을 통한 분만 후 병원에서 모유 수유법 습득 및 실천 강화, 둘째,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의 확산을 들고 있다. 모자동실(母子同室)이야 이제 제법 보편화된 듯 하나, BFHI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도 많지 않은 것 같다.
BFHI 운동이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이 1991년에 12개 시범 국가에서 시작,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도해오고 있는 운동으로, 병원에서 출산 직후부터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분만의 80% 이상이 병원에서 이뤄지며, 아기 출산 후 2, 3일간 병원에서 아기에게 무엇을 먹이는가가 수유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현실에 입각한 것이다. 현재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FH)'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15,000개가 넘는다. 2) 한국의 경우 99년 10개이던 것이 2005년 9월 현재 51개에 달한다. 3) 2005년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BFHI 운동의 연원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WHO와 UNICEF는 모유 수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 ‘모유 수유의 보호, 권장 및 후원'(Protecting, Promoting and
Supporting Breastfeeding)이라는 32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공동 제작·발간하였다.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생후 12개월 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16.5%이다. 반면 유럽은 75%, 미국 52%,
일본 45%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2) http://www.unicef.org/programme/breastfeeding/baby.htm
3) 한국의 BFH 목록은 UNICEF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bf/work.asp
참조